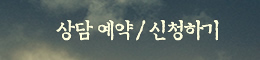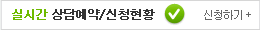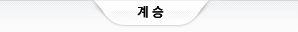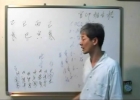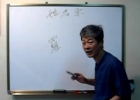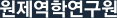한국 풍수의 변화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 풍수의 변화
인문적 경관이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재의 지표면이란 과거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지리학에서는 역사적 지각현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지표를 점유하고 생활을 영위해 온 이래 그들은 주거지역이 풍토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리적 사고를 성숙·발전시켜 어떤 형태를 갖춘 논리를 구성하여 갔을 것이다. 풍수설 역시 그와 같은 지리적 사고의 성숙·발전된 특이한 논리체계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발행하여 그곳에서 이론의 확립을 본 후 우리 나라에 도입된 풍수설은 다른 지역의 풍수설과는 매우 다른 본질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거의 독창적인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풍수사상이 우리 나라에 처음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신라 선승 도선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이 풍수사상은 불교와 아무런 모순 없이 이해되고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의 선승들에 있어서는 풍수지리설은 일반 대중 교화상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풍수사상은 고려시대에 들어서 불교와 도참사상과 함께 사회를 이끈 주도적 사상경향의 하나였고 고려시대 정치사상을 비롯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리사상이다.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초기에는 조금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듯하다. 세종 이후에 일부 유신들 사이에 강력한 풍수 배척론이 등장하고 풍수설은 민간신앙화하여 일반 민간에서 분묘에 치중하는 술법으로 전략하였다. 그후, 풍수사상은 실학자들이 날카롭게 핵심을 찔러, 정약용과 박제가는 풍수설 자체의 허망함과 근거 없음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상술한 부정론(否定論)은 풍수이론체계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비난이 아니라 그로 인한 관습·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지리풍수(地理風水) - blog.naver.com/zingongsi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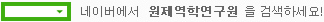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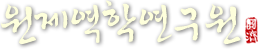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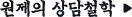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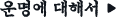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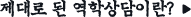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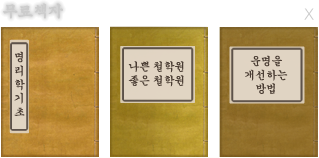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